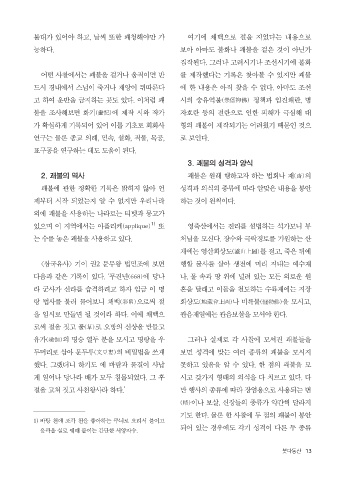Page 15 - 붓다동산762호
P. 15
불대가 있어야 하고, 날씨 또한 쾌청해야만 가 여기에 채백으로 절을 지었다는 내용으로
능하다. 보아 아마도 불화나 괘불을 걸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고려시기나 조선시기에 불화
어떤 사찰에서는 괘불을 걸거나 움직이면 반 를 제작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있지만 괘불
드시 경내에서 스님이 죽거나 재앙이 뒤따른다 에 한 내용은 아직 찾을 수 없다. 아마도 조선
고 하여 운반을 금지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괘 시의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과 임진왜란, 병
불을 조사해보면 화기 (畵記)에 제작 시와 작가 자호란 등의 전란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대
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회화사 형의 괘불이 제작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
연구는 물론 종교 의례, 민속, 설화, 직물, 목공, 로 보인다.
표구공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괘불의 성격과 양식
2. 괘불의 역사 괘불은 원래 행하고자 하는 법회나 재 (齋)의
괘불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밝히지 않아 언 성격과 의식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봉안
제부터 시작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에 괘불을 사용하는 나라로는 티벳과 몽고가
1)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아플리케 (applique) 또 영축산에서는 진리를 설법하는 석가모니 부
는 수를 놓은 괘불을 사용하고 있다. 처님을 모신다. 장수와 극락정토를 기원하는 산
재에는 영산회상도 (靈山上圖)를 걸고, 죽은 뒤에
<삼국유사> 기이 권2 문무왕 법민조에 보면 행할 불사를 살아 생전에 미리 지내는 예수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진년 (668)에 당나 나, 물 속과 땅 위에 널려 있는 모든 외로운 원
라 군사가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자 임금 이 명 혼을 달래고 이들을 천도하는 수륙재에는 지장
랑 법사를 불러 물어보니 채백 (彩帛)으로써 절 회상도 (地藏會上圖)나 미륵불 (彌勒佛)을 모시고,
을 임시로 만들면 될 것이라 하다. 이에 채백으 관음재일에는 관음보살을 모셔야 한다.
로써 절을 짓고 풀 (草)로 오방의 신상을 만들고
유가 (瑜伽)의 명승 열두 분을 모시고 명랑을 우 그러나 실제로 각 사찰에 모셔진 괘불들을
두머리로 삼아 문두루 (文豆婁)의 비밀법을 쓰게 보면 성격에 맞는 여러 종류의 괘불을 모시지
했다. 그랬더니 하기도 에 바람과 물결이 사납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점의 괘불을 모
게 일어나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되었다. 그 후 시고 갖가지 형태의 의식을 다 치르고 있다. 다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라 하다.’ 만 행사의 종류에 따라 장엄용으로 사용되는 번
(幡)이나 보살, 신장들의 종류가 약간씩 달라지
기도 한다. 물론 한 사찰에 두 점의 괘불이 봉안
1) 바탕 천에 조각 천을 좋아하는 무늬로 오려서 붙이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기 성격이 다른 두 종류
윤곽을 실로 꿰매 붙이는 간단한 서양자수.
붓다동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