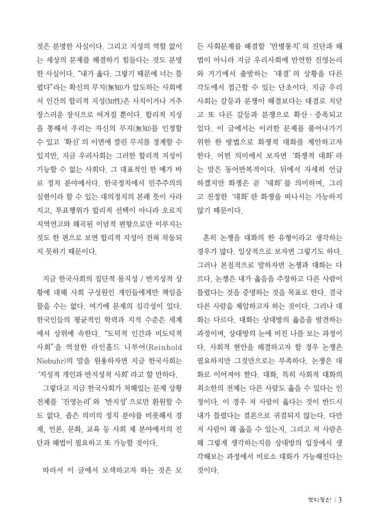Page 5 - 붓다동산747호
P. 5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성의 역할 없이 든 사회문제를 해결할‘만병통치’의 진단과 해
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도 분명 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진영논리
한 사실이다.“내가 옳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 와 거기에서 출발하는‘대결’의 상황을 다른
렸다”라는 확신의 무지(無知)가 압도하는 사회에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단초이다. 지금 우리
서 인간의 합리적 지성(知性)은 사치이거나 거추 사회는 갈등과 분쟁이 해결보다는 대결로 치닫
장스러운 장식으로 여겨질 뿐이다. 합리적 지성 고 또 다른 갈등과 분쟁으로 확산·증폭되고
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지(無知)를 인정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수 있고‘확신’의 이면에 깔린 무지를 경계할 수 위한 한 방법으로 화쟁적 대화를 제안하고자
있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그러한 합리적 지성이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화쟁적 대화’라
기능할 수 없는 사회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바 는 말은 동어반복적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
로 정치 분야에서다.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의 하겠지만 화쟁은 곧‘대화’를 의미하며, 그리
실현이라 할 수 있는 대의정치의 본래 뜻이 사라 고 진정한‘대화’란 화쟁을 떠나서는 가능하지
지고, 투표행위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오로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연고와 왜곡된 이념적 편향으로만 이루지는 흔히 논쟁을 대화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편으로 보면 합리적 지성이 전혀 작동되 경우가 많다. 일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기도 하다.
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논쟁과 대화는 다
지금 한국사회의 집단적 몰지성 / 반지성적 상 르다. 논쟁은 내가 옳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황에 대해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물을 수는 없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학력과 지적 수준은 세계 화는 다르다. 대화는 상대방의 옳음을 발견하는
에서 상위에 속한다.“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과정이며,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를 보는 과정이
사회”을 역설한 라인홀드 니부어(Reinhold 다.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논쟁은
의Niebuhr) 말을 원용하자면 지금 한국사회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논쟁은 대
‘지성적 개인과 반지성적 사회’라고 할 만하다. 화로 이어져야 한다. 대화, 특히 사회적 대화의
그렇다고 지금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문제 상황 최소한의 전제는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는 인
전체를‘진영논리’와‘반지성’으로만 환원할 수 정이다. 이 경우 저 사람이 옳다는 것이 반드시
도 없다. 좁은 의미의 정치 분야를 비롯해서 경 내가 틀렸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다만
제, 언론, 문화, 교육 등 사회 제 분야에서의 진 저 사람이 왜 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단과 해법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
따라서 이 글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모 각해보는 과정에서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3